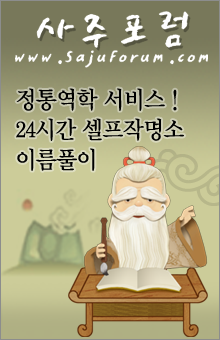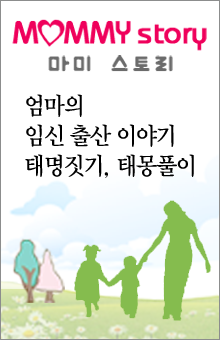| 나의 뿌리를 찾아서 ... |

 |
|
www.rootsinfo.co.kr |
성씨의 종류와 유래
성씨의 역사
족보 이야기
친인척 호칭법
국가 연대표
역대왕 연대표
성씨별 인구순위
본관별 인구순위
고사성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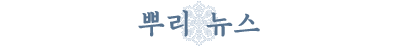 본관(本貫)을 향관(鄕貫)ㆍ성관(姓貫)ㆍ본적(本籍)ㆍ관적(貫籍)ㆍ관향(貫鄕)이라고도 부른다. 본관은 어느 한 시대 조상의 거주지인 지명과 공간의 연속성을 나타내며 성씨(姓氏)는 부계의 혈통과 시간의 연속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관도 같고 성씨도 같으면 부계친족의 친근성이 밀접해지는 것이다. 성씨와 본관의 관계를 열거하면 동성동본(同姓同本)ㆍ동성이본(同姓異本)ㆍ이성동본(異姓同本)ㆍ이성이본(異姓異本)으로 분류한다. 본관이 형성된 시기는 고려 초기로 본다. 본관을 정하는 지명은 거의 대동강 입구에서 원산만을 잇는 선의 이남이다. 이 선의 이남은 통일신라와 고려 초기의 군(郡)ㆍ현(縣)으로 구성돼있기 때문이다. 후고구려의 궁예 집권 당시 문하시중으로 있던 왕건이 918년에 고려를 건국했다. 이때 남방에는 후백제 '견훤'과 신라 '경순왕'이 있었는데 이를 정벌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치하에 있는 각 성주를 흡수할 필요가 있었다. 왕건은 우선 신라를 정복하려고 안동 '고창ㆍ복주'에 왔을 때 안동성주 김행이 정세를 파악하고는 그에게 고을을 바쳐 항복했다. 이에 고창을 '동쪽지역이 평안하게 됐다'는 뜻의 '안동(安東)'이라 하고는 왕이 그를 '권'이라는 성씨를 내렸다. 따라서 김행은 경주김씨에서 안동권씨로 넘어가 권씨의 시조가 된다. 이때에 김(金)ㆍ장(張)ㆍ강(姜)ㆍ조(曹)ㆍ고(高)ㆍ이(李)씨가 추가돼 모두 7개의 성씨가 안동을 본관으로 한 토성이다. 그 후 또 남방을 정벌키 위해 남한강에 이르자, 서목(徐穆)이 강을 건너는 데 도움을 줬다해 지명을 이천(利川)으로 바꾸고 서목에게 본관을 내리므로 이천 서씨의 시조가 됐다. 또 경북 성주는 성산ㆍ벽진ㆍ경산ㆍ광평이라 하다가 고려 충렬왕 34년에 성주(星州)라 불렸다. 따라서 경북성주 지역을 본관으로 하는 이씨는 경산(京山)ㆍ벽진(碧珍)ㆍ광평(廣平)ㆍ성산(星山)ㆍ성주(星州) 등 5개다. 원래 본관과 성씨를 합쳐 토성이라 하는데 이는 '토성분정(土星分定)'에서 유래됐다. 즉 '토'는 지역과 지연을 뜻하는 본관이고 '성'은 혈연의 뜻을 가진 성씨다. 토성은 천자가 제후에게 행하는 의례인데 이때 성씨는 제후의 출생지니 나라 이름을 따라 정해진다. 예컨대 춘추시대 정(鄭)ㆍ송(宋)ㆍ오(吳)는 나라의 이름이면서 제후의 성씨가 된다. 왕건은 '토성분정'을 시행해 940년에 전국을 군ㆍ현 명칭으로 개정한다. 신라의 경순왕 김부(金傅)도 항복해 오자 계림(鷄林)은 '경사스러운 고을'이란 뜻으로 경주(慶州)라 했다. 또 발해의 세자 대광현도 고려에 귀순해오자 왕씨의 성을 줘 우대했다. 조선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성씨의 수는 약 250개 내외이며 본관 수는 현(縣) 이상만 하더라도 530여 개나 되고 촌락을 본관으로 한 촌성(村姓)과 향(鄕)ㆍ소(所)ㆍ부곡(部曲)ㆍ장(莊)ㆍ역(驛)ㆍ수(戍)까지 합산하면 15세기 이전에 존속했던 본관 수는 1천500개가 넘는다. 이같이 후삼국의 지방분권을 통제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본관과 성씨를 준 것은 그들에게 충성을 받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왕건은 통일신라의 폐쇄적인 골품제도를 무너뜨리고 소외된 지방유력층을 새 지배층에 편입시켜 신왕조 질서 수립에 도움을 얻고자 본관과 성씨를 주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그리고 일반 천민은 1909년 일제의 민적법 정리에 따라 오늘날과 같이 온 국민에게 성씨와 이름을 부여했다. 2015년 2월 2일 경남매일신문 송종복 문학박사(사학전공)/(사)경남향토사연구회ㆍ회장 |

 HOME >
HOME >